[김재성 칼럼] 설날은 날마다 '오늘'이다.
설날 단상, 달력을 바꾼다고 설이 아니다.
김재성 주필
승인
2019.02.04 22:00 | 최종 수정 2019.03.27 12:57
의견
8

[한국정경신문 김재성 주필] <까치, 까치 설 날은 어저께고요 /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 이래요> 윤극영 작사의 이 동요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참 심오하다.
어제는 가버리고 없는 날이다. 그러니 어제가 설날인 까치는 일 년 내내 설날이 없는 셈이다. 반면에 오늘은 날마다 오늘이다. 그러니 일 년 내내 설날이다. 그런즉 어제에 사는 사람은 까치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오늘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설렘으로 사는 사람이다.
시간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흐른다.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시간은 흘러 가버려 과거가 된다. 과거는 이미 과거이니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는 것이다. 시간이 한 순간도 멈추지 않으니 엄밀히 말하면 현재도 없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으니 시간은 실체가 없다.
시간은 부단히 흐를 뿐이다.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과정이다. 시간의 흐름은 사물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나, 그리고 삼라만상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천지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변하기 때문에 영속할 수 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그 이치는 만고불변이다. 변화는 선이다. 순리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새로운 탄생이다. 그래서 순리다. 새로운 탄생은 아름답다. ‘오늘’은 ‘오는 날,’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날이다. 변화의 현재진행이다. 변하고 화化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다. 새 것과 만나는 설렘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까치의 설날은 어제이고 우리들의 설날은 오늘이다.
오늘(2월 5일)은 설날이다. 내일이 되면 내일도 오늘이다. 그러므로 내일도 설날이다. 모레도 마찬가지다. 호주의 원주민 가운데 생일은 물론 설날 같은 것을 기념하지 않는 부족이 있다. 미개해서 그런가? 천만에‥.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은 저절로 가는 것, 작년 보다 올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만이 알 수 있다”
그렇다. 새 날은 없다. 하늘 아래 새 것도 없다. 모든 새로운 것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다. 내 안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나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 산이면서 산이 아님, 물이면서 물이 아님을 보는 지견이 열리는 날, 그 날이 설날이다. 나의 내면에서 날마다 영성의 고양이 일어나면 달력을 바꾸지 않아도 그날이 설날이다. 어느날 새삼스럽게 아내가 고맙고 남편이 든든하면 그 또 한 설날이다.
영성靈性의 고양高揚은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농부철학자 피에르 라비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 자기 내면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사막의 광대함이 인간들로 하여금 깊은 명상에 빠지게 한다는 뜻이다. 외부인의 눈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뿐이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성의 수직상승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창틀의 종이컵 속에서 고개를 내 민 새 순,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흙먼지 같았을 씨앗 속에 우주의 자양분이 들어있었던가?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一微塵中含十方>는 경전 한 구절을 실감한다. 열린 눈으로 보면 일상이 기적이니 날마다 새롭게 볼 일이다. 날마다 오는 ‘오늘’이 설날이라는 노래가 국민동요가 된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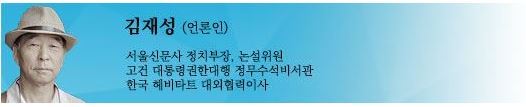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